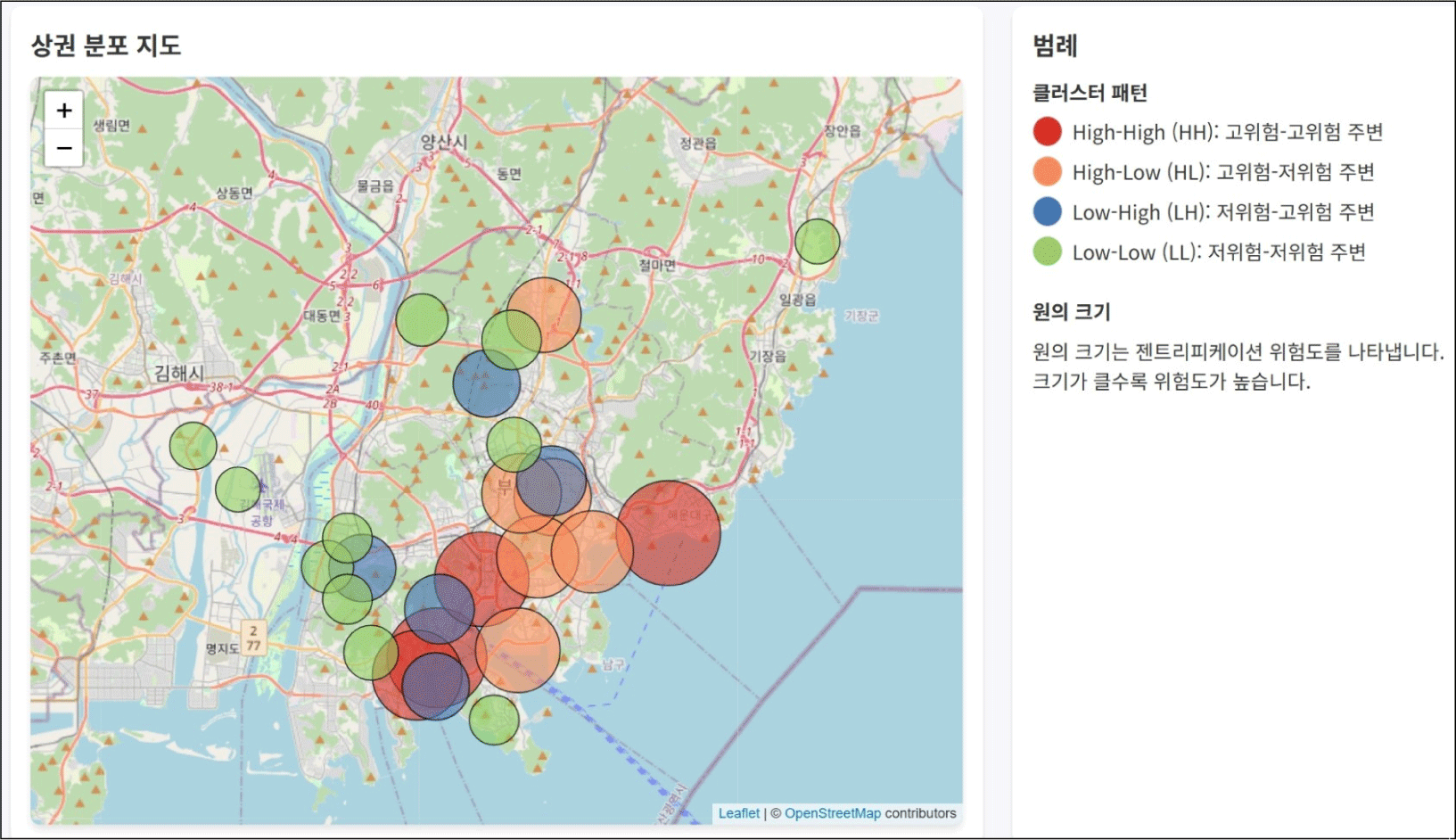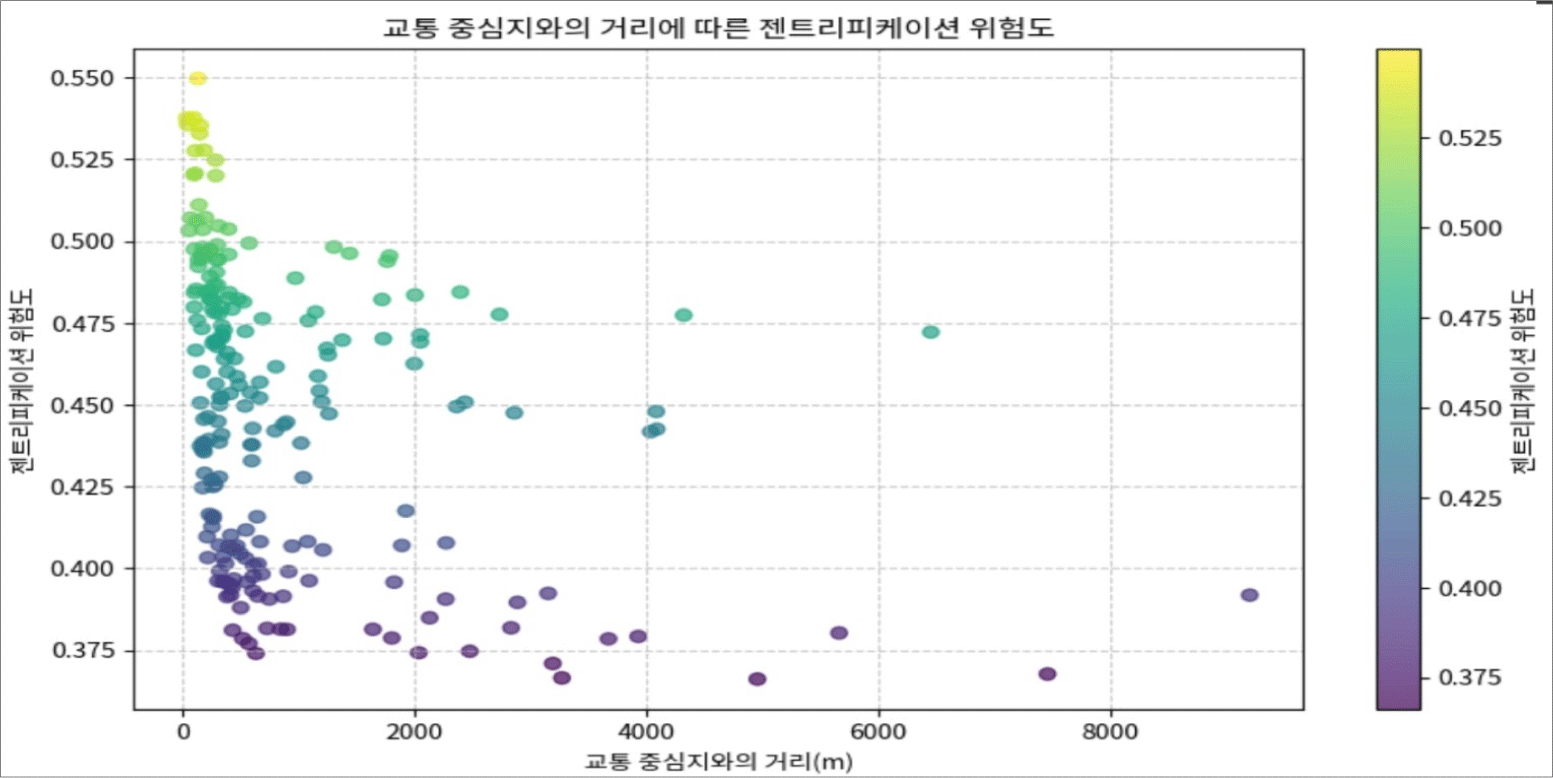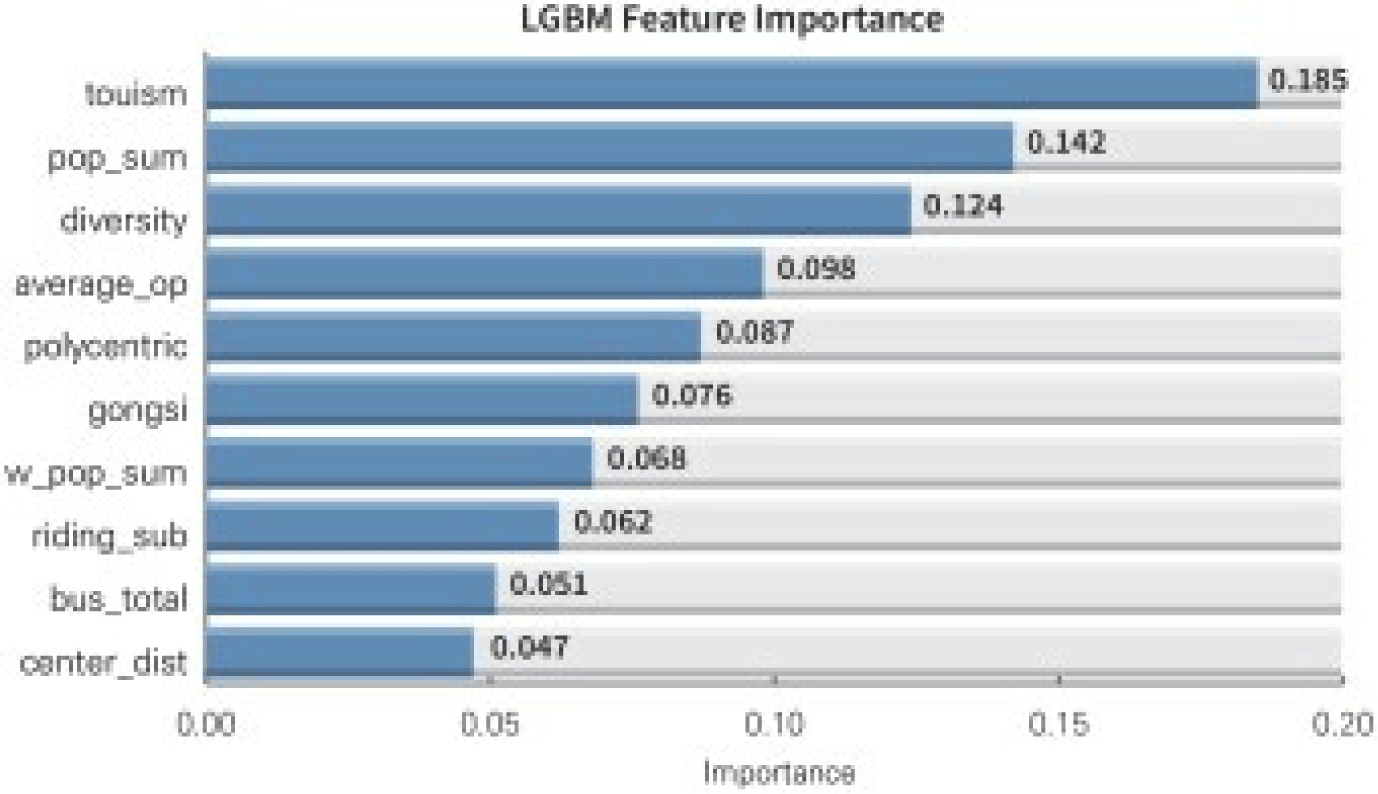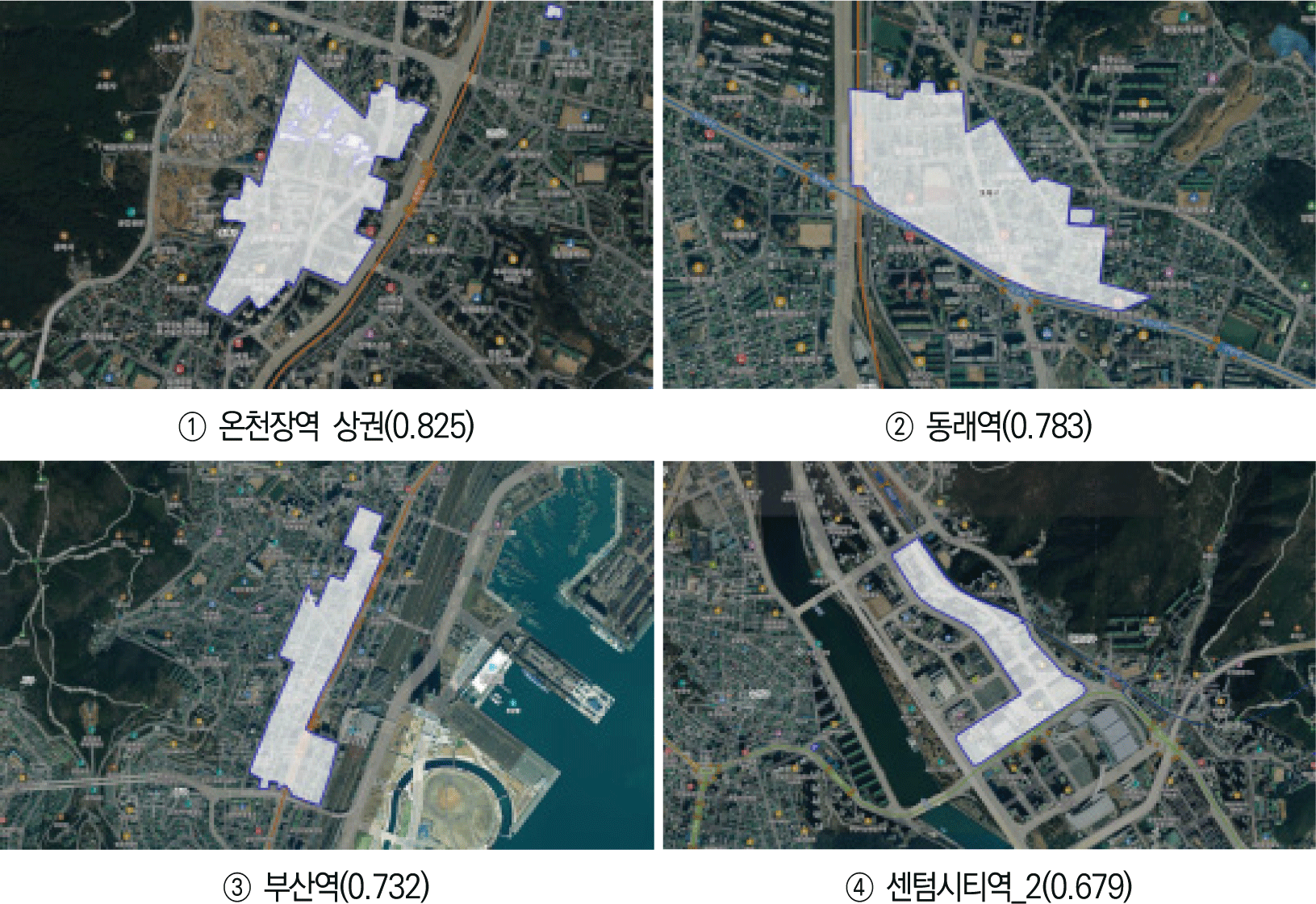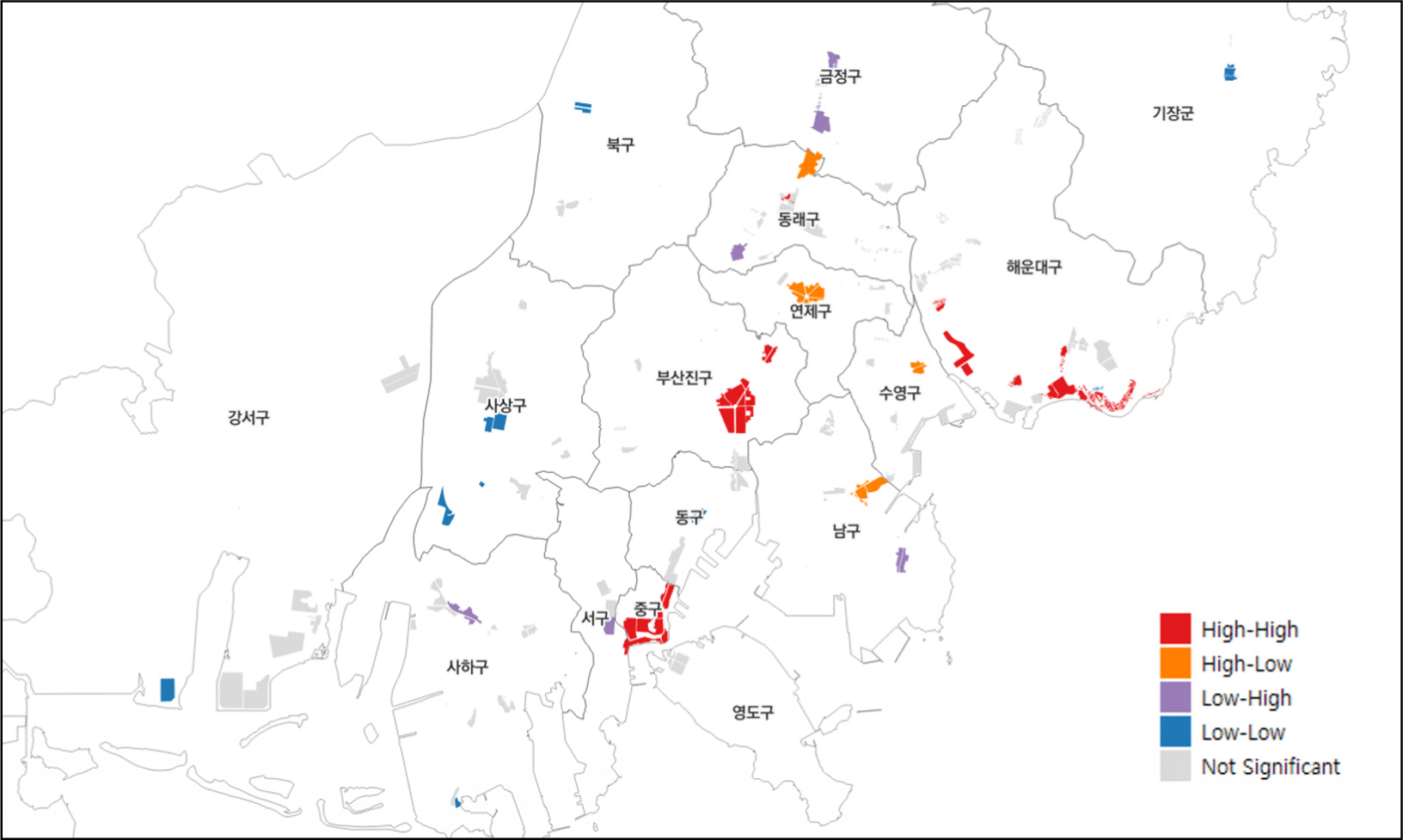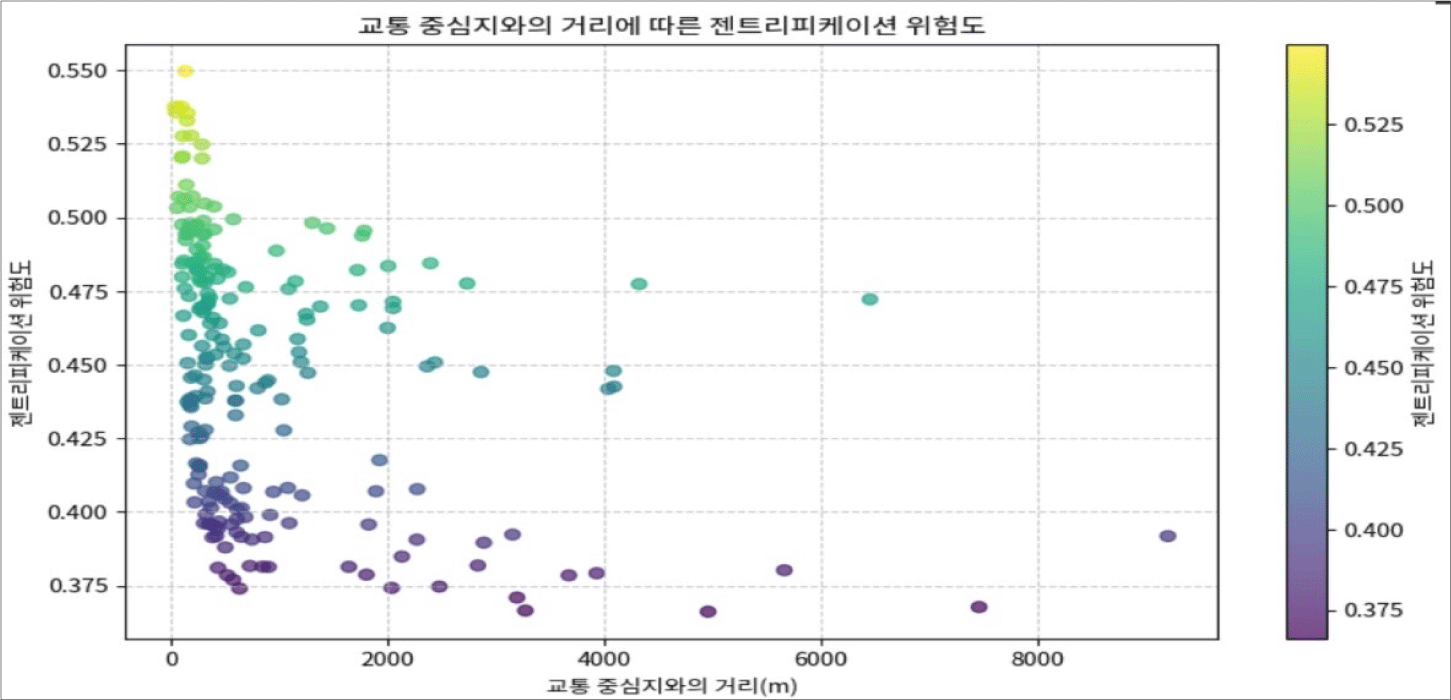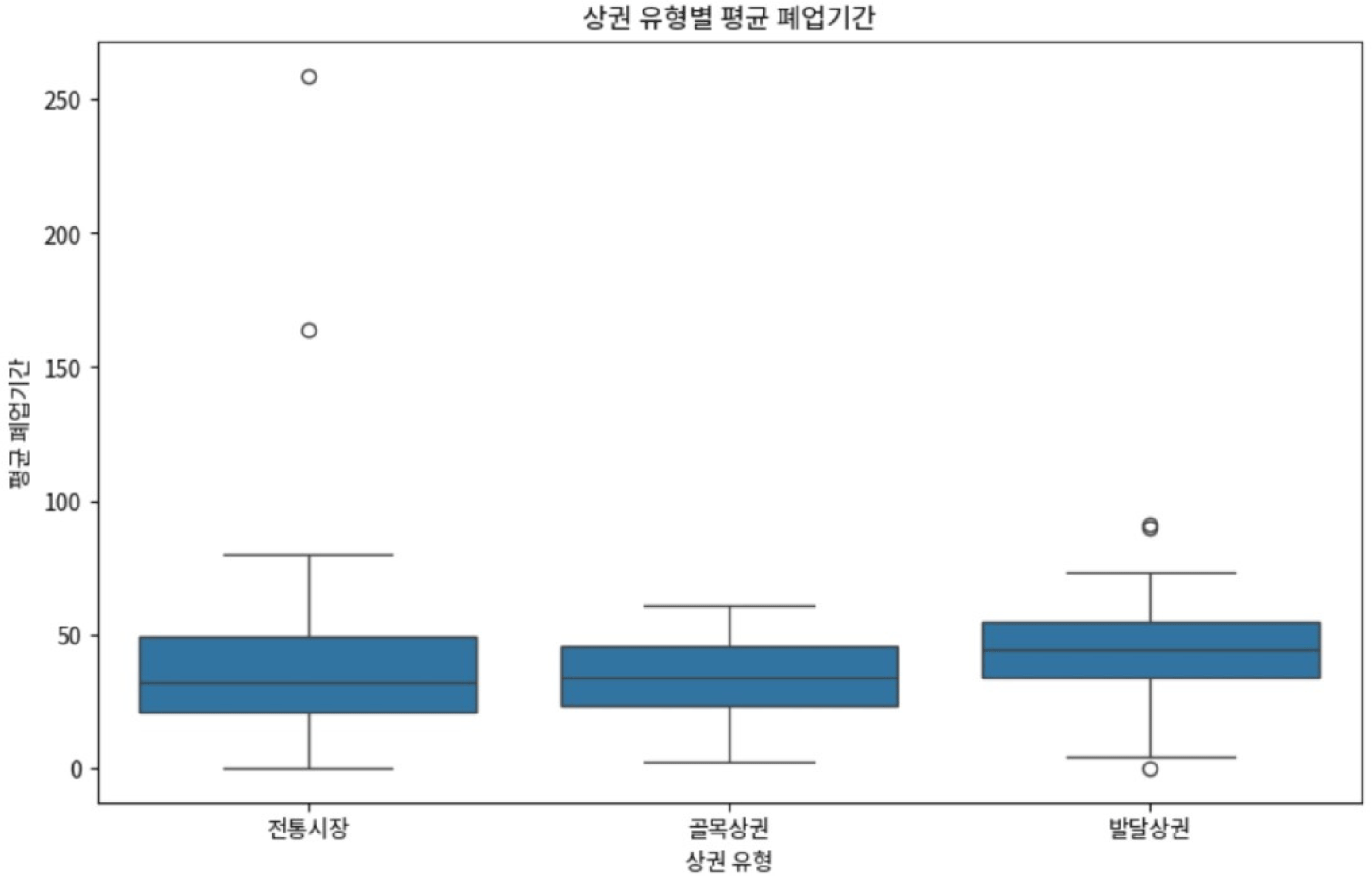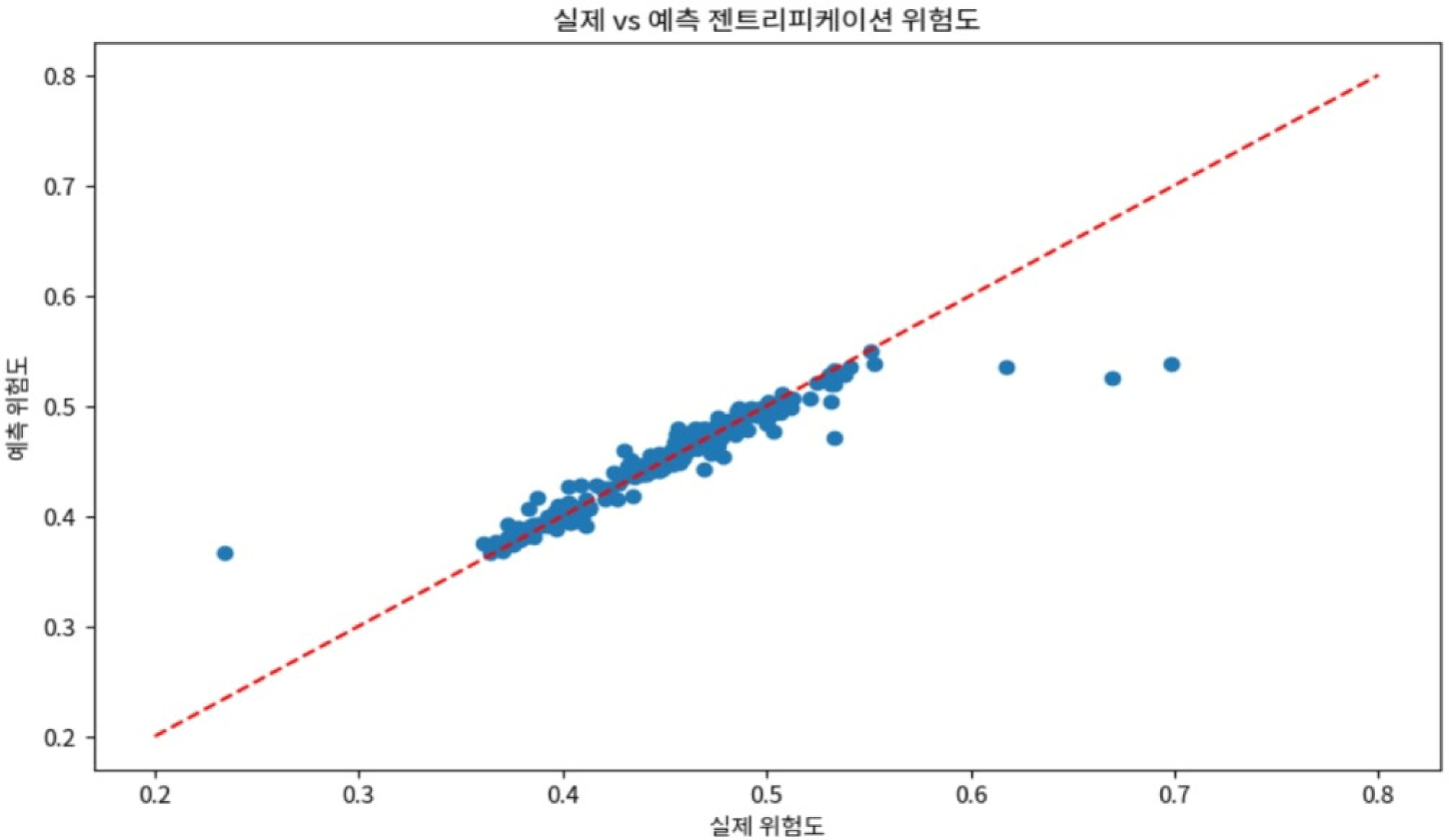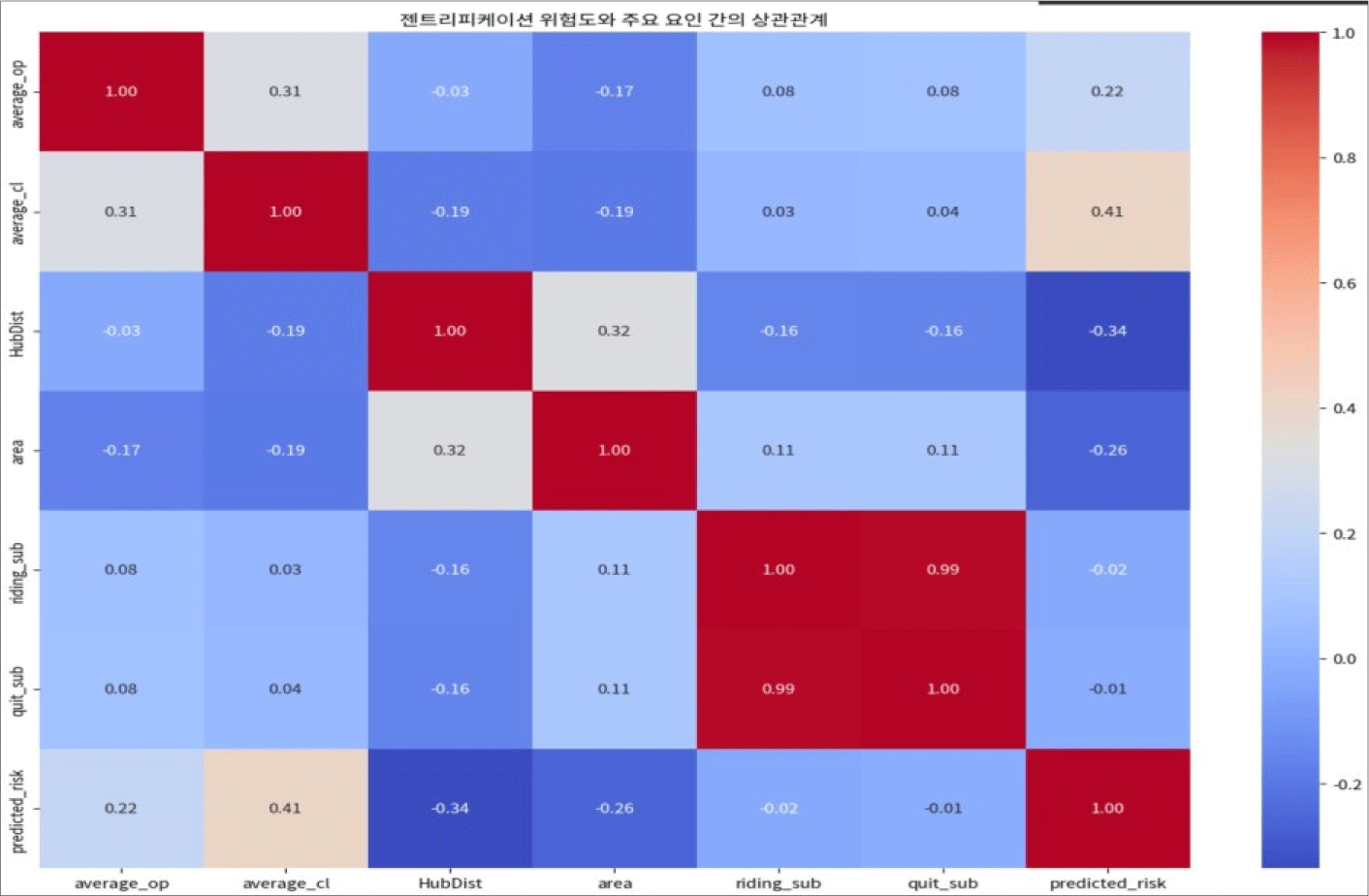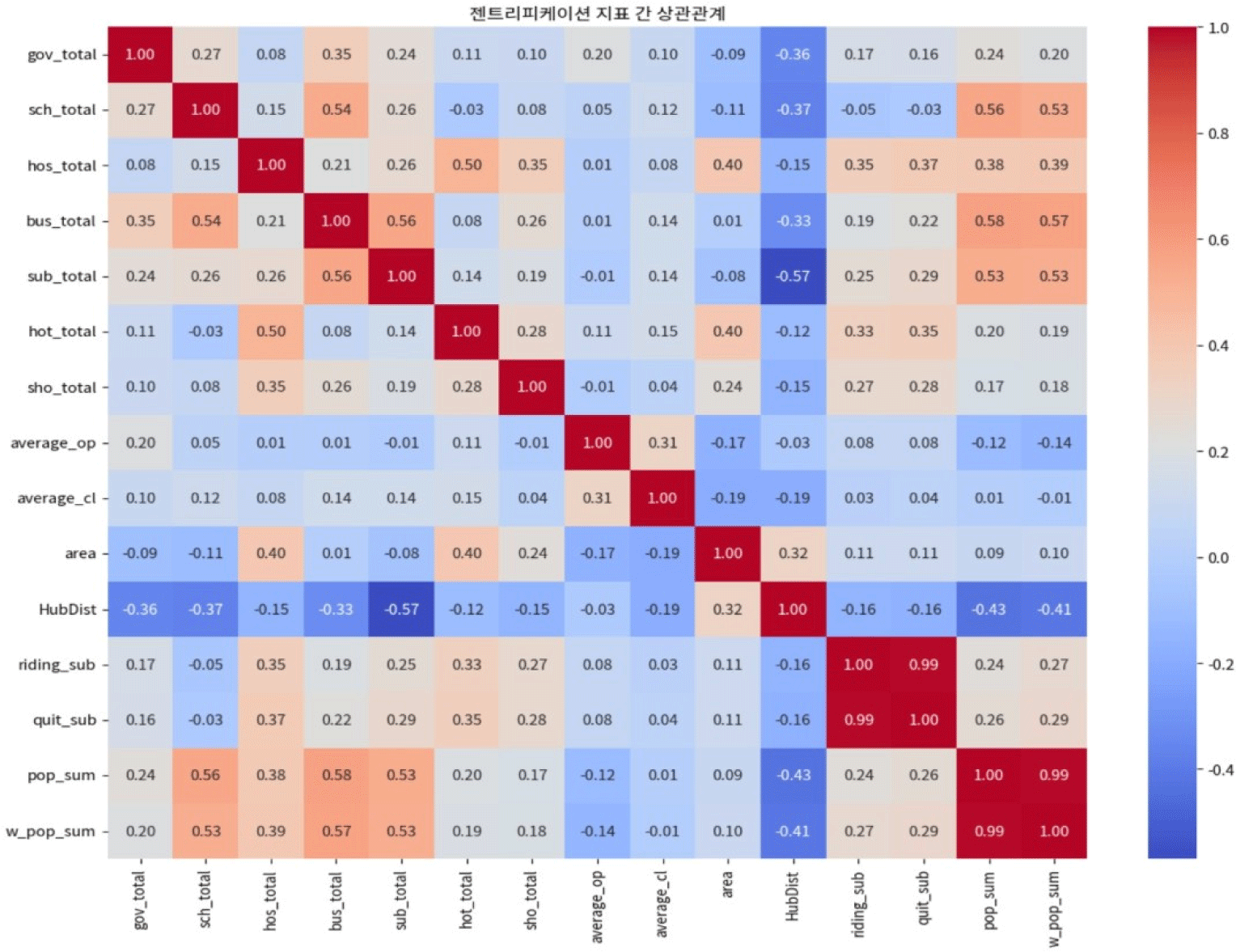Ⅰ. 서론
오늘날 부산광역시의 도시 공간 및 지역 상권 패러다임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근린 도시재생 과정에서 심화된 상권 경쟁과 가파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상권 붕괴 및 경제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김형균, 2016; 송복섭, 2023; 최누리·김인신, 2022). 이러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관련 진단체계 연구(심경미·이상민, 2018)와 코로나19 이후 상권 변화 분석(조은주, 2020)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젊은 층 이탈,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 심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동반되면서 지역 사회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이근·김대래, 2017). 이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 상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권변화에 대한 예측 및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산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부산일보, 2014), 2016년 부산시는 원도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신정훈, 2016).
부산광역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산악 지형과 해안선의 분포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구의 고유한 문화적 및 상업적 특색을 살린 독립적인 상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이정헌, 2009). 이로 인해, 부산광역시는 수도권과 달리 단일 중심 상권 구조가 아닌, 각 상권이 서로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면서도 경제적 연계성을 통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다핵상권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박지은, 2019; 이선영·주경식, 2008). 이러한 다핵상권 구조는 상권 간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확대라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상권 불균형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지역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운대와 광안리는 Glaeser et al.(2001)이 제시한 소비도시(consumer city) 모델에 부합하는 관광지화와 상업적 고급화 전략을 통해 고급 호텔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상업 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운대 지역은 2016년 이후 상권 변화가 가속화되면서(연합뉴스, 2016) 관광객 증가와 대형 상업시설 입점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기존 상인들의 경영난을 초래하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였다(부산광역시, 2017, 2020). 이러한 관광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해운대뿐만 아니라 광안리 등 부산의 주요 관광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연합뉴스, 2017). 또한, 남포동과 중구는 전통 상권의 현대화 과정에서 관광객을 겨냥한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 및 상업 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전통 소규모 점포들의 퇴출이 초래되었다. 결과적으로, 특정 상권의 고급화와 현대화는 인접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진행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의 사회적 문제로서 젠트리피케이션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우양호(2019)는 감천문화마을 사례연구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진화 과정과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방안을 모색하였고, 황영숙·정쾌호(2022)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차인 이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부산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연구는 정이근·김대래(2017)가 부산 전역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이후, 김동현 외(2018)이 머신러닝 기법으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고, 최근에는 이건학(2023)이 7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공간적 특성과 단계별 전개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한층 정교화되고 있다. 임상연 외(2017)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향을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최누리·김인신(2022)은 부산시 카페의 생존 분석을 통해 프랜차이즈와 독립 카페 간의 생존율 차이를 비교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상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김종성·김걸(2020)은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특성과 지수 분석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국제적으로 Murphy(2008)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관찰한 제3세대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이 관광과 결합된 젠트리피케이션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 대도시의 공간적 확산 패턴을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Brown-Saracino(2010)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의 지역적 편중 문제가 부산과 같은 지방 대도시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대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부산광역시는 다핵 도시구조와 관광 중심의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서울과는 다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메커니즘과 공간적 확산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Lees et al.(2016)이 제시한 전지구적 젠트리피케이션(planetary gentrification) 관점에서 지역별 차별화된 젠트리피케이션 양상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부산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연구는 정이근·김대래(2017)가 부산의 둥지 내몰림 현상과 대응 방안을 분석한 데서 출발하였다. 이어서 김동현 외(2018)은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 서울시 상업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결정 요인을 정량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분석 방법을 고도화하였고, 이건학(2023)은 7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공간적 단계성과 확산 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연구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지방 대도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공간 확산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심경미·이상민(2018)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 연구 등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다핵 상권 구조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실증 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다양한 상권을 발달상권,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를 측정하고, 그 결정요인과 공간적 확산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Ke et al.(2017)이 개발한 머신러닝 기법(light gradient boosting machine, LGBM) 모델을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214개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를 예측하고 상권 유형별 차이를 분석한다. LGBM 모델은 높은 예측 정확도와 효율적인 계산 성능을 제공하여 복잡한 도시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평가된다. 둘째,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상권 유형별로 차별화된 결정요인을 도출한다. 셋째, 공간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인접 상권 간 확산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넷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권 유형별 맞춤형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Moran's I, 공간 시차 모형(spatial lag model) 등의 공간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부산광역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 및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공간적 확산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부산의 다핵 상권 구조와 관광지 특성을 반영한 변수를 활용하여 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예측 모델을 통해 도출된 고위험 상권의 공간적 분포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다핵상권구조 특성을 반영한 젠트리피케이션 분석을 위한 체계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네 단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이론적 고찰 단계에서는 부산의 다핵상권구조와 젠트리피케이션 이론의 접점을 탐색하여 개념적 토대를 확립한다. 둘째,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단계에서는 상권정보, 인구통계, 공시지가, 관광·접근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실증적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분석 모델 적용 단계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LGBM, 랜덤 포레스트, XGBoost)과 공간계량경제학적 방법론(Moran's I, 공간시차모형)을 병행 활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예측적 측면과 공간적 확산 패턴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및 정책 함의 단계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도 결정요인과 공간적 확산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였다.
II. 다핵상권구조와 젠트리피케이션의 관계
다핵도시구조(polycentric urban structure) 이론은 Harris & Ullman(1945)이 제안한 개념으로, 이후 Anas et al.(1998)과 Giuliano & Small(1991)에 의해 대도시권 다핵구조의 실증적 분석이 발전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도시는 기능적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중심지가 형성되며, 각 중심지는 특화된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업무 중심지, 상업 중심지, 문화 중심지 등이 도시 내에 분산되어 존재한다. 다핵도시구조는 교통 발달, 토지이용 변화, 경제활동의 분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Anas et al., 1998).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교통 혼잡, 지가 상승,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기능의 분산이 가속화되면서 다핵구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Giuliano & Small, 1991).
다핵상권구조(polycentric commercial district structure)는 다핵도시구조의 한 형태로, 도시 내에 여러 개의 상업 중심지가 존재하는 구조를 말한다. 다핵상권구조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권 간 기능적 차별화가 나타난다. 각 상권은 특화된 업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Berry, 1963). 예를 들어, 패션 특화 상권, 음식점 밀집 상권, 문화예술 상권 등이 도시 내에 분산되어 존재한다. 둘째, 상권 간 위계구조가 형성된다. 중심상권과 주변상권으로 구분되며, 중심상권은 광역적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주변상권은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특성을 보인다(Davies, 1972). 셋째, 상권 간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상권 간 보완적 관계와 경쟁적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는 상권의 발전과 쇠퇴에 영향을 미친다(Meijers, 2007).
다핵상권구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일 중심지 모델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첫째, 젠트리피케이션의 확산 패턴이 복잡하게 나타난다. 여러 중심지에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심지 간 상호작용에 의해 확산 속도와 방향이 영향을 받는다(Lees, 2000). 둘째, 상권별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양상과 결정요인이 다르게 나타난다. 상권의 특성(업종 구성, 규모, 접근성 등)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속도와 영향이 달라진다(Bridge & Dowling, 2001; Zukin et al., 2009). 국내에서도 신현준(2016)이 한남동 창의계급과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이한 유형들을 분석하여 이러한 차별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중심-주변 상권 간 젠트리피케이션의 전이 효과(spillover effect)가 발생한다. 중심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변상권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Meltzer & Ghorbani, 2017).
본 연구에서는 공간시차모형(spatial lag model, SLM)을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다핵상권구조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공간적 확산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1차 인접 상권까지의 유의한 확산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다핵 상권 구조는 도시 내에 단일한 중심 상권이 아닌, 여러 개의 독립적인 상권이 상호작용하며 도시 경제를 구성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핵 상권 구조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각 상권은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가진다(Harris & Ullman, 1945). 아울러, 이러한 다핵 상권 구조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특정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인접 상권에 파급효과를 미치거나, 반대로 다른 상권의 성장으로 인해 특정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억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핵상권구조의 형성 과정 및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 1>은 부산광역시 다핵 상권 구조의 단계별 형성 과정을 Harris & Ullman(1945)의 다핵도시 이론에 기반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부산의 다핵 상권 구조는 초기 단계(태동기), 성장 단계(확산기), 분화 단계(전문화기), 연계 단계(통합 네트워크기)의 4단계 발전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다.
| 구분 | 주요 특징 및 사례 | 참고문헌 |
|---|---|---|
| 초기 단계 | • 단일 중심(동래 및 남포동 일대)에서 시작 • 개항기 이후 부산항 주변(남포동, 광복동 일대)을 중심으로 태동 •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공설시장과 국제시장이 형성되었고, 도시 팽창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부평동, 범일동, 서면, 부전동 등지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며 다핵화의 기초를 마련 → 단일 중심 상권에서 다핵 상권으로 전환되는 출발점 |
부산광역시(2025), Busan Metropolitan City(2023), Kim & Kim(2022) |
| 성장 단계 | • 196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인구와 경제 규모가 급증하며 도시 공간이 팽창하고 상업 활동이 확대 • 1980년대 초대형 백화점(태화백화점, 롯데백화점)의 등장과 함께 서면이 교통 요충지이자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부산 최대 상권으로 부상하며 도심 상권의 다핵화가 가시화 • 1990년대에는 서면-남포동의 이중 중심 체제에 동래(온천장)·부산 역권 등 부도심이 더해진 다핵 상권 구조로 성장 |
부산광역시(2025), Busan Metropolitan City(2023), Kim & Kim(2022) |
| 분화 단계 | • 2000년대에 들어 해운대권 상권이 급부상하며 다핵 상권 구조가 정착되고 각 핵심 상권의 기능적 분화가 뚜렷해짐 • 해운대(센텀시티-해운대해수욕장)와 광안리는 관광·레저 및 고급 소비로 기능적 특성화 • 남포동·광복동은 재래시장과 관광 상권으로 특성화 • 서면 상권은 젊은 층을 위한 패션, 음식, 유흥과 함께 의료·학원 등 도심형 서비스가 밀집한 종합 중심지로 특성화 |
김상현·이한나(2016), Fujita & Thisse(2013), Kim & Kim(2022) |
| 연계 단계 | • 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 개통을 통해 서면-해운대-광안리-남포동 간 상권 연계/접근성 강화 • 북항 재개발, 광복동 롯데타운 조성 등을 통한 원도심과 신도심의 공간적 연계 및 균형 발전 전략 추진 • 부산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4대 핵심 도심 중심의 광역 도시 네트워크 구축 |
김상현·이한나(2016) |
초기 단계는 개항 이후 남포동과 동래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단일 중심 상권 체계에서 출발하였으며(Busan Metropolitan City, 2023), 성장 단계에서는 도시 인구 증가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배경으로 서면 등 새로운 부도심이 발달하면서 다핵 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김상현·이한나, 2016; Busan Metropolitan City, 2023). 분화 단계에서는 해운대, 광안리 등 신흥 상권이 부상하면서 각 상권별 고유한 기능적 특성과 업종 구성의 전문화가 진행되었으며(Fujita & Thisse, 2013), 연계 단계에서는 도시철도 및 도로망 구축을 통해 독립적이었던 개별 상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상권 간 시너지 효과와 도시 전체의 상업적 경쟁력 제고가 실현되었다(김상현·이한나, 2016).
이러한 단계적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부산시는 2023년 확정된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도심•부도심 이원 체계에서 기능별 특화를 통한 10개 중심(코어)과 6개 생활권으로 구성된 다핵 도시구조 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상권의 공간적 분산과 기능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였다(권기정, 2023).
이러한 단계별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다핵상권 구조 내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및 확산 위험을 공간적으로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각 상권의 형성 단계와 발전 특성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본 연구의 머신러닝 및 공간시차모델 적용을 통해 상권 간의 공간적 상호작용과 확산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다핵 상권 구조는 초기 단계, 성장 단계, 분화 단계, 연계 단계의 네 가지 단계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초기 단계는 개항 이후 남포동과 동래지역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단일 중심 상권에서 시작되었으며(Busan Metropolitan City, 2023), 성장 단계에서는 도시의 인구 증가와 교통망 발전을 계기로 서면과 같은 새로운 부도심이 발달하며 다핵 구조로 전환되었다.
<그림 1>은 부산광역시의 다핵상권 구조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본 지도는 부산 상권의 공간적 분포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시각화한 결과로, 상권은 해안선과 산악지형을 따라 분산되어 있으며, 이는 부산의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상권별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는 LGBM 기반 예측모델 결과에 따라 원의 크기로 표현되었으며, Moran’s I와 LISA(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분석을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성 유형이 색상으로 구분되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High-High(고위험-고위험 주변) 클러스터는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가 높은 상권이 인접 지역과 함께 군집된 형태를 의미하며, 해운대, 광안리, 서면 등 주요 상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핵상권 구조에서 중심 상권 간 상호작용이 젠트리피케이션의 공간적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설과 일치한다.
따라서 <그림 1>은 부산광역시 내 다핵상권 구조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의 공간적 분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결과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2>는 Fujita & Thisse(2013)의 공간경제학 이론을 토대로 부산광역시의 다핵 상권 구조의 특징을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를 의미하는 다양성(diversity), 지역 경제 안정성 강화를 의미하는 분산성(dispersal), 도시 경쟁력 제고를 의미하는 연계성(connectivity),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를 의미하는 유연성(flexibility) 등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권 회복 탄력성은 조은주(2020)의 신용카드 매출 분석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4)의 빅데이터 통계가 지적하듯 매출 변동성과 직결된다. 부산광역시의 다핵 상권 구조는 다양성, 분산성, 연계성, 유연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가진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서면·해운대·남포동 등 각 상권이 고유한 특성과 업종 구성을 형성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산성 측면에서는 단일 중심지가 아닌 여러 부도심과 지역 상권으로 경제활동이 분산되어 도시 내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혼잡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나타낸다(Fujita & Thisse, 2013). 연계성 측면에서는 도시철도와 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의 발달로 다수의 상권 간 상호작용과 접근성을 높여 도시 전체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 상권 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부산일보, 2024). 유연성 측면에서는 COVID-19와 같은 외부 충격에도 상권별 특성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도시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적응력과 회복탄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부산광역시, 2025; 부산신용보증재단, 2021).
| 구분 | 주요 특징 및 사례 | 참고문헌 |
|---|---|---|
| 다양성 | • 남포동(재래시장), 서면(종합상권), 해운대(MICE, 고급소비), 광안리(관광, 유흥) 등 각기 특화된 다양한 기능의 상권 공존 • 다양한 업종 및 소비 형태로 도시 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지역 상권 혁신 촉진 |
Fujita & Thisse(2013), Jacobs(1969) |
| 분산성 | • 하나의 중심(남포동, 서면)에서 해운대, 사상, 기장 등 외곽으로 상권이 분산되며 균형적 발전 촉진 • 도시 전체 교통 혼잡과 과밀화 문제 완화 및 생활권 단위의 근거리 상권 형성 |
Busan Metropolitan City(2023), Fujita & Thisse(2013) |
| 연계성 | • 부산 도시철도(서면-해운대-광안리-남포동 등)와 도로교통(광안대교 등) 인프라로 상권 간 이동 및 상호작용 촉진 •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남포동과 해운대 분산 개최 등 상권 간 시너지 효과 창출 |
Busan Metropolitan City(2023) |
| 유연성 | • 원도심(남포동) 쇠퇴 시 서면, 해운대 등 다른 상권이 보완적 역할 수행하며 도시 전체의 회복탄력성 향상 • 센텀시티(영상산업), 서부산(스마트시티) 등 도시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
부산광역시(2025), 부산신용보증재단(2021), 부산일보(20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조은주(2020) |
이러한 부산광역시의 다핵 상권 구조의 특징은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공간적 분포와 위험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부산광역시의 다핵 상권 구조는 다양성, 분산성, 연계성, 유연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가진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서면·해운대·남포동 등 각 상권이 고유한 특성과 업종 구성을 형성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권 간의 상호의존성과 확산 효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변 상권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머신러닝과 공간시차모델을 활용하여 다핵 상권 구조 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확산과 전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예측·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의 차별화된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대응과 관리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Glass(1964)가 런던의 도심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외부 자본과 중산층 유입으로 지역 환경이 개선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기존 저소득층과 영세 상인이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한다(Atkinson & Bridge, 2005).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공동체 해체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며(Glaeser et al., 2001; Lees et al., 2008), 발생 맥락과 특성에 따라 상업, 관광, 주거,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Gotham, 2005).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Smith(1979)가 제시한 지대격차 이론(rent gap theory)에서 출발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자본의 도심 회귀 현상으로, 현재 지가와 잠재적 최고 지가 간의 격차가 클수록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설명된다(Smith, 1996).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Ley(1986)는 캐나다 도시 사례를 통해 Smith의 경제결정론적 관점에 대응하여 신 중산층(new middle class)의 문화적 선호와 후기 근대적 소비 지향적 생활양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접근은 경제적 동기보다는 도시 생활의 질적 향상과 문화적 편의시설 추구를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 동력으로 파악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김걸(2007)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원인과 설명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 요인(소득, 지가, 임대료)과 사회문화적 요인(교육수준, 직업구성, 생활양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단일 요인이 아닌 다차원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임을 보여주는 국내 초기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관광과 문화적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Ley의 문화적 접근이 Smith의 경제적 접근과 함께 통합적 분석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다핵상권구조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상권 유형별로 차별화된 발현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2018년 이후 서면 및 해운대 핵심상권에서 가속화되고 있으며(부산광역시, 2020), 광복로, 중앙동, 송정동 등 주요 상권에서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김재홍, 2017). 이는 임대료 상승압력과 영세상인의 입지 이탈이라는 전형적인 시장 조정 과정을 보여주며, 특히 서면 상권에서 발생한 지대 상승 효과가 공간적 확산을 통해 인접한 전포동 상권으로 전이되는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의 공간적 파급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
반면, 센텀시티와 같은 대규모 신규 개발지역에서는 Davidson & Lees(2005)가 런던 템스강변 재개발 사례에서 분석한 신축형 젠트리피케이션(new-build gentrification)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를 통한 점진적 고급화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 전체의 급속한 고급화를 의미하며, 부동산 가치 상승과 용도 전환을 동반하는 구조적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관광 젠트리피케이션은 해운대, 광안리, 감천문화마을에서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른 지역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발현되고 있다(Kim & Holifield, 2024). 특히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Debord(1967)의 스펙터클(spectacle)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형적 사례로, 지역 공동체의 진정성(authenticity)이 관광 상품화 과정에서 소실되면서 주민의 일상적 생활공간이 소비 대상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해운대 지역에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고급 호텔, 쇼핑몰 등 관광상업시설의 집적과 지역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광안리 일대에서는 해변가 관광시설과 유흥업소의 증가로 기존 소규모 업소들이 입지 경쟁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관찰된다. 감천문화마을에서는 예술마을화에 따른 관광객 유입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주민들의 간접적 이주 압박이 발생하고 있다. 관광 특구 지정 이후 외부 자본의 급격한 유입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광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유예지·김주락(2024)은 양양 서핑 관광지 사례를 통해 해양레저관광이 어촌 지역에 미치는 젠트리피케이션 영향과 지역주민의 대응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규명하였다.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은 감천문화마을 등 원도심 지역에서 관광지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기존 저소득층의 외곽 지역 이주를 초래 하였다(우양호, 2019). 이러한 주거 이동 현상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Freeman(2005)은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거 이동성을 강제적 이주(displacement)와 자연적 세대교체(succession)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틀을 부산의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강제적 이주는 임대료 상승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 기존 주민이 비자발적으로 거주지를 떠나는 현상을 의미하며, 자연적 세대교체는 기존 주민의 자발적 이주와 새로운 주민의 유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뜻한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주거 젠트리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나타나는 상인들의 이동 양상을 이해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희연·심재헌(2009)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젠트리파이어의 주거이동 패턴과 이주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구 이동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동력을 규명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단순한 인구 교체가 아닌 복합적인 사회공간적 변화 과정임을 보여준다.
또한 Ding et al.(2016)이 필라델피아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한 젠트리피케이션과 주거 이동성 간의 통계적 상관관계 역시 부산의 원도심 지역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주거 이동성이 지역적 특수성을 초월한 보편적 도시 현상임을 시사한다.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은 중앙동 40계단과 영도 흰여울문화마을에서 문화콘텐츠의 상업화 과정에서 임대료 부담 증가로 예술인들이 이주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Zukin(2009)이 지적한 도시 공간의 진정성(authenticity) 상실과 상업적 동질화 현상의 전형적 사례로 해석된다. 이러한 유형별 젠트리피케이션은 부산의 다핵상권 내에서 공간적 확산과 차별화라는 복합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핵 상권 구조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을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의 다핵 상권 구조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험도 예측이 중요하다(<표 3>).
| 구분 | 주요 특징 및 사례 | 참고문헌 |
|---|---|---|
|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 • 서면 중심상권의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과 기존 상인들의 이탈 • 전포동 등 주변지역으로 상권 이동 및 공실률 증가 • 프랜차이즈, 자본력이 강한 업종으로 업종 구조 재편 • 경성대/부경대 및 부산대 일대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영세상인 이탈과 공실 증가 현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송복섭(2023), 이건학(2023), 현가영(2023) |
| 관광 젠트리피케이션 | • 해운대 지역의 관광객 증가로 인한 고급 호텔, 쇼핑몰 등 관광상업시설 증가 및 지역 물가 상승 • 광안리 일대 해변가 관광시설과 유흥업소의 증가로 기존 소규모 업소 밀려남 • 남포동(광복동)의 전통시장 관광화로 기존 업종 퇴출과 관광객 중심 상업구조로 변화 • 감천문화마을의 예술마을화로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 및 주민 간접적 둥지내몰림(displacement pressure) 현상 발생 |
우양호(2019), 유예지·김주락(2024), 이건학(2023), Kim & Holifield(2024) |
|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 • 감천문화마을의 관광지화로 인해 부동산 가치와 임대료 상승, 원주민의 간접적·직접적 이주 압박 증가 • 중구·동구 등 원도심 주거지 내 개발사업과 부동산 투자로 주거비 상승, 저소득층 주민 외곽 이전 촉진 •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 현상으로 지역 공동체 약화 및 사회적 불평등 심화 |
민경진(2021)송복섭(2023), 우양호(2019), 임상연 외(2017) |
| 문화 젠트리피케이션 | •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창작공간(또따또가 등) 조성 후 임대료 급등, 초기 예술인 및 소상공인 이탈 • 영도 흰여울문화마을과 초량 이바구길 등 관광객 증가로 임대료 상승 및 원주민 가게 축소, 프랜차이즈 업소 증가 • 전포동 카페거리, 광복로 상권에서 소규모 점포 임차인 임대료 부담으로 내몰림 현상 발생 |
민경진(2021), 성현곤·이슬기(2018), 송복섭(2023), 신정훈(2016), 우양호(2019), Gotham(2005), Zukin et al.(2009) |
Ⅲ. 연구 방법
젠트리피케이션은 시간적 추이와 공간적 상호작용이 얽힌 복합적인 과정으로, 비선형적 관계나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을 띠는 등 그 양상이 다층적이고 복잡하다(김동현 외, 2018; 안지현, 2018).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공간적 군집 및 확산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시공간 통계 기법이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등 젠트리피케이션 예측 정확도가 높은 방법론이 활용되지만, 모형 설정 및 해석의 복잡성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머신러닝과 Moran's I 지수 기반 공간 자기상관 분석, 그리고 공간 시차 모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다핵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 및 공간적 확산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간계량경제학적 분석에서 Anselin(1988)의 공간경제학 방법론은 젠트리피케이션의 공간적 확산을 분석하는 핵심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특히 공간시차모형을 통한 인접 지역 간 상호작용 분석이 가능하다. Moran's I를 통해 부산 상권들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가 인접 상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클러스터(고위험 군집)를 형성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머신러닝 기법은 다차원적 도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공간적 발생 확률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데 효과적인 분석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Alejandro & Palafox, 2019; Reades et al., 2019).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서 텍스트마이닝과 같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현곤 외(2019)은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국토 및 도시계획 연구 동향 분석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도시 현상 분석에서 데이터 기반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Reades et al.(2019)은 런던의 근린지역 변화 패턴 분석을 통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복잡한 공간적 확산 메커니즘과 비선형적 발생 패턴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으며, 이는 전통적 계량경제학적 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예측 모델링 방법론으로 평가된다. 국내 연구에서도 김동현 외(2018)이 서울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예측 정확도를 검증함으로써, 국내 부동산 시장 환경에서의 머신러닝 기반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방법론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머신러닝이 공간적 상호작용이나 인접 지역 간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부산의 다핵적 상권 구조와 관광 상권 중심의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확산 경로를 규명하고자 Moran’s I와 공간 시차 모형 등의 공간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Moran’s I를 통해 부산 상권들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가 인접 상권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클러스터(고위험 군집)를 형성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또한 공간 시차 모형은 인접 지역의 영향(공간 지연 효과)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특정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가 주변 상권의 위험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확산 계수)를 추정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특정 상권에서 시작된 젠트리피케이션이 공간적으로 전파되는 경로와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부산광역시의 214개 상권으로, 7대 핵심상권(서면, 남포동/광복동, 해운대, 센텀시티, 동래, 부산대, 광안리)과 207개 일반상권(전통시장 65개, 발달상권 102개, 골목상권 47개)을 포함한다. 상권의 공간적 범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권영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상권의 중심점(centroid)을 기준으로 공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상권별 젠트리피케이션 예측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의 공공데이터를 GIS 상에서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부산시 상권에 대한 기본 정보와 상권 변화 추이는 부산시 공공데이터포털의 상권 변화지표 현황 데이터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상권 내 업종 구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상권)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크게 상가업소정보, 공시지가, 인구통계, 교통 데이터로 구분된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각 데이터의 출처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가업소정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상권별 업종 분포, 개폐업 현황, 매출액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 데이터를 통해 상권의 활성화 정도, 업종 변화, 폐업률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공시지가 데이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정보로, 상권 내 토지의 가치 변화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었다.
셋째, 인구통계 데이터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부산광역시의 행정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상권 주변의 인구 특성(연령, 소득, 교육 수준 등)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였다.
넷째, 교통 데이터는 부산교통공사와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지하철 승하차 인원, 버스 정류장 위치, 도로망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상권의 접근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횡단면(cross-sectional) 분석에 가깝다. 즉, 2022년 시점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2018~2022년 기간의 변화율(공시지가 변화율, 업종 변화율 등)을 독립변수로 활용하는 정태적(static)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 214개 상권에 대한 충분한 시계열 데이터(5년 이상)가 확보되지 않아 시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의 동태적 과정을 분석하기 어려웠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다핵 상권 구조에서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 크기가 필요했으며, 이는 횡단면 분석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셋째, 젠트리피케이션의 공간적 확산 효과에 대한 분석이 시간적 진행 과정보다 본 연구의 초점이었기 때문이다.
<표 4>에서 최종적으로 독립변수 25개와 타깃변수 1개(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여부)로 구성된 26개의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타깃변수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여부(gentrification)'는 0(미발생) 또는 1(발생)의 이진(binary) 값으로 정의하였다. 특정 상권이 '발생(1)'으로 분류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변수 설계는 Helms(2003)가 제시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도시 주택 리노베이션 결정요인 분석 틀을 참고하여, 물리적 환경 요인(건물 노후도, 시설 분포), 경제적 요인(공시지가, 매출액 변화), 접근성 요인(교통 중심지와의 거리), 인구통계학적 요인(인구구성, 연령분포)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였다.
타깃변수인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여부는 지난 5년(2018∼2022년)간 해당 상권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부산시 전체 평균 상승률의 1.5배 이상이면서, 동 기간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데이터 기준 유흥•오락 및 고급 음식점 업종 수가 20% 이상 증가하였거나, 주요 언론 보도 및 선행연구(김형균, 2016; 정이근·김대래, 2017)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지역으로 명시된 경우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를 '발생(1)'으로, 이 외의 상권은 '미발생(0)'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깃변수 설정 기준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 모델(공시지가 1.5배, 유흥업종 20% 증가 기준)에 더해, 임계값을 변화시킨 대안 모델(공시지가 1.2배/1.8배, 유흥업종 15%/25% 증가)을 구성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민감도 분석 결과, 임계값 변화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12%∼18%), 상권 위험도의 상대적 순위와 주요 결정요인의 중요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요 고위험 상권(온천장역, 동래역, 부산역, 센텀시티역)은 모든 대안 모델에서 일관되게 상위 위험군으로 식별되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분석에는 기준선(benchmark) 모델로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를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는 본래 이진 분류 모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확률 출력 모드로 설정하여 각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을 0~1 사이의 연속 확률값으로 산출하였다. 이후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앙상블 기반의 트리 계열 알고리즘 다섯 종—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GBM),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팅(XGBoost), 라이트GBM(LightGBM), 캣부스트(CatBoost)를 적용하여 총 6개 모델의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모델 구현은 Python 기반의 scikit-learn, LightGBM, CatBoost 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모든 모델은 확률 예측 모드로 설정하여 각 상권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을 수치적으로 도출하였다.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는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를 확률값으로 추정하는 회귀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으며, 결정계수(R²), 평균절대오차(mean absolute error, MAE),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MSE),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등의 회귀 기반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표 5>에서 LGBM 모델이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에는 LGBM을 중심으로 후속 튜닝 및 해석을 진행하였다.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은 기존의 전수 탐색 방식(grid search)보다 효율적인 탐색이 가능한 Bayesian optimization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탐색-활용 균형(exploration-exploitation balance)을 고려하여 이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퍼파라미터 공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최적값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초기 성능 비교를 통해 LGBM 모델이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예측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본 연구는 LGBM을 최종 분석 대상 모델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2>는 교통 중심지와의 거리에 따라 부산광역시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산점도이다. X축은 상권 중심점과 가장 가까운 교통 중심지(지하철역 또는 버스터미널) 간의 직선거리이며, Y축은 LGBM 모델을 통해 산출된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이다. 시각화된 결과에 따르면, 교통 중심지에서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된다. 특히 500m 이내의 상권은 0.55 이상의 고위험군이 집중되며, 4,000m 이상에서는 위험도가 0.4 이하로 낮아지는 경향이 명확히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자본 유입과 상권 고급화를 유인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촉진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Fujita & Thisse, 2013; Giuliano & Small, 1991; Glaeser et al., 2001). 특히 Fujita & Thisse(2013)는 중심지로부터의 접근 용이성이 도시 내 경제활동의 집중 및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으며, Giuliano & Small(1991)은 교통 허브 주변이 다핵 상권의 중심축으로 작용하면서 고소득 소비자와 고급 상업시설이 집적되는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추가하는 동시에, 교통 인프라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간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표 6>에서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후, 최적 성능을 보인 모델의 feature importance를 분석하여 주요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미발생(0)'으로 분류된 상권들 가운데 예측된 위험도(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확률)가 높은 지역을 추가적으로 식별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위험성이 높은 잠재적 발생 지역을 사전에 포착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선제적 관리와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가중치 행렬 설정 방식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 K-최근접 이웃(k-NN) 이외에 거리역가중(distance-based inverse weighting) 행렬과 반경기반(radius-based) 행렬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표 6>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가중치 행렬 설정 방식에 따라 공간자기상관(Moran's I)과 공간확산계수(ρ)의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공간 자기상관과 확산 효과가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이는 부산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공간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이 가중치 행렬 설정 방식에 관계없이 강건함을 보여준다.
또한 <표 7>은 공간확산 효과가 1차 이웃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2∼3차 이웃으로는 빠르게 감쇠함을 나타낸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위험이 직접 인접 상권에 국한되어 전파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 이웃 차수 | 공간확산계수 ρ | 표준오차 | z-값 | p-value |
|---|---|---|---|---|
| 1차 이웃 | 0.280 | 0.096 | 2.917 | 0.041 |
| 2차 이웃 | 0.112 | 0.087 | 1.287 | 0.198 |
| 3차 이웃 | 0.053 | 0.076 | 0.697 | 0.486 |
머신러닝 예측 결과를 보완하고 공간적 확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공간계량경제 모형 중 공간 시차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시 214개 상권(분석에 활용된 최종 표본)의 공간적 인접 행렬을 구축하였다. 인접성 정의는 상권 간 물리적 경계 공유가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 상권에 대해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k-nearest neighbors) 을 인접 단위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공간 가중치 행렬 W를 구성하였다. 이 방식은 상권이 직접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거리 기반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어, 상권 간 공간 파급효과 분석에 적합하다.
Moran’s I 지표를 산출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의 공간 자기상관을 진단한 결과, 유의미한 양(+)의 자기상관이 검정되어(유의수준 0.05), 고위험 상권들이 공간적으로 군집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LISA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별 핫스팟을 지도상에 표시하고, 군집의 시각화를 통해 부산 내 젠트리피케이션 고위험 지대들의 공간적 분포와 연결성을 해석하였다.
이러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SLM 모형을 구성하였는데, 모형 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Y는 LGBM 모델을 통해 예측된 각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확률값(0과 1 사이의 연속형 변수) 벡터이다. WY는 인접 상권들의 젠트리피케이션 예측 확률값을 공간 가중치 행렬 W로 가중 평균한 공간 시차 변수(spatial lag variable)이며, ρ는 공간적 자기회귀 계수(spatial autoregressive coefficient) 또는 공간 확산 계수를 나타낸다. X는 앞서 정의한 독립변수들의 행렬이며, β는 각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벡터, ε는 오차항이다.
SLM을 통해 추정된 ρ 값이 양(+)으로 유의하면, 인접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이 해당 상권의 위험도를 높이는 공간 파급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반대로 ρ가 0에 가깝거나 유의하지 않으면 주변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우도추정(MLE)을 통해 SLM의 모수들을 추정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공간효과를 제외한 OLS 모형과도 결과를 대조하였다(<표 8>).
| 하이퍼파라미터 | 탐색된 범위 | 최적값(선정된 값) |
|---|---|---|
| num_leaves | 10~100 | 45 |
| learning_rate | 0.001~0.1 | 0.03 |
| n_estimators | 50~500 | 250 |
| max_depth | 3~15 | 7 |
| min_child_weight | 1~20 | 6 |
IV. 연구분석 결과
<그림 3>에서 상위 10개 변수의 중요도를 나타낸 그림으로, 관광특성(tourism) 변수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LGBM 모델의 feature importance 상위 변수들을 살펴보면,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 특성 변수(tourism)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그림에서 보이듯 tourism 더미변수가 가장 높은 중요도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관광상권 여부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모델에 따르면 관광지 인접 상권은 그렇지 않은 상권보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두 번째로 중요도가 높은 변수는 상권 주변 인구수로,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많은 배후 인구가 상권 성장의 기반이 되어 외부 투자유입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로는 업종다양성 변화(diversity)가 꼽혔는데, 최근 몇 년간 업종 구조가 급변한 상권일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의 징후가 포착되었다. 다양성 지수가 감소(특정 업종 과점화)하거나 특정 업종이 급증한 지역은 상권 구조 재편이 진행 중인 곳으로, 모델이 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평균 생존개월수, 다핵상권 여부, 공시지가 상승률, 생산가능인구 등이 중요 변수로 도출되었다.
모델의 예측 결과에 대한 해석은 Lundberg & Lee(2017)가 개발한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SHAP는 게임 이론의 Shapley value에 기반하여 각 변수가 개별 예측에 미치는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통합적 모델 해석 접근법으로, 블랙박스 모델의 예측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LGBM 모델의 feature importance 상위 변수들을 살펴보면,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특성(tourism) 변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두 번째로 중요도가 높은 변수는 상권 주변 인구수(pop_sum)이며, 세 번째로는 업종다양성 변화(diversity)가 도출되었다.
SHAP 값 분석 결과, 관광특성(tourism) 변수는 값이 1(관광상권)일 때 위험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수(pop_sum)는 약 15,000명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위험도 상승 효과가 급격히 커지는 비선형적 관계를 보였다. 업종다양성 변화(diversity)는 양의 변화(다양성 증가)가 위험도를 높이지만, 그 영향력은 임계점(0.2)을 초과할 때 더욱 강해지는 특성을 보였다.
<그림 4>에서 부산광역시의 기존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지역을 제외한 잠재적 위험 상권 분석에서, 온천장역(위험도 0.825), 동래역(0.783), 부산역(0.732), 센텀시티역(0.679) 상권이 높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를 나타냈다. 이들 상권은 각각 Zukin(2009)의 문화자본 상품화, Smith(1996)의 지대격차 이론, Harvey(1989)의 교통결절점 자본축적 및 Gotham(2005)의 관광 젠트리피케이션, Debord(1967)의 스펙터클 및 Bridge & Dowling(2001)의 소매고급화 이론으로 설명되는 차별적 젠트리피케이션 경로를 보였다. 이들 상권은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경로를 보이고 있다.
온천장역 상권은 온천 관광지에서 상업시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가 상승이 나타난 전형적 사례로, Smith(1996)가 체계화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도시 개척지(urban frontier) 개념과 지대격차 이론의 실증적 적용 사례로 해석된다. 즉, 기존 토지 이용의 잠재적 수익성이 현실화되면서 자본 투입과 공간 재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동래역 상권은 교통 결절점으로서 접근성 증가에 따른 상업적 가치 상승으로 Harvey(1989)의 교통 인프라 기반 자본 축적 과정과 일치한다. 부산역 상권은 관광객 증가와 관광 소비에 특화된 업종 구성 변화를 보이며 Gotham(2005)의 관광 젠트리피케이션 특성을 드러낸다. 센텀시티역 상권은 첨단 산업과 고급 소매업이 집중되면서 Bridge & Dowling(2001)이 제시한 소매 고급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동학은 Lees et al.(2016)이 제시한 '행성적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처럼 동일 도시 내에서도 지역적 맥락과 특수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됨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준다. 따라서 각 상권의 맥락적·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젠트리피케이션 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이다.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자면, 관광, 인구, 상권변화, 중심지 효과, 부동산 상승이 부산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발생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량적 결과는 부산 사례연구에서 지적된 내용을 뒷받침한다. 특히, 관광 활성화는 부동산 가치상승과 상업 고급화를 촉진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인구 유입과 소비 잠재력이 큰 지역일수록 개발 자본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권 내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고 업종구성이 재편되는 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 확률이 높고, 이는 기존 지역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부분 의존성 도표(partial dependence plot)를 통해 주요 변수들과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였다. 교통 중심지와의 거리(center_dist)는 약 1,000m까지 위험도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인구수(pop_sum)는 약 20,000명까지는 위험도와 선형적 비례관계를 보이다가 이후 영향력이 정체되는 특성을 보인다. 업종다양성 변화(diversity)는 -0.1에서 +0.3 구간에서 위험도와 비례하지만, 그 이상의 급격한 다양성 증가는 오히려 위험도를 다소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비선형적 관계는 선형회귀모형이 아닌 머신러닝 기법의 활용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표 9>에서 머신러닝 모델로 식별된 고위험 상권들이 실제로 공간적으로도 인접한 군집을 형성하는지 확인하고, 주변 상권으로의 파급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공간계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권 간 경계가 명확히 접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접성 정의 방식으로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s) 기반의 공간 가중치 행렬을 적용하였다. 각 상권에 대해 가장 가까운 4개의 이웃을 인접 단위로 설정한 후 Moran’s I 지수를 분석한 결과, 부산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에 대해 I값 ≈ +0.16(p<0.01) 정도의 양의 자기상관이 관찰되었다. 이는 고위험 값들이 인접 지역에 모여 있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 N(표본 수) | 공간 가중치 방식 | Moran’s I | 기대값(E[I]) | Z-score | p-value |
|---|---|---|---|---|---|
| 189 | k-NN(k=4) | +0.160 | –0.0053 | 2.715 | 0.0066*** |
<그림 5>에서 Moran’s I LISA 클러스터 맵에서는 해운대 관광권과 서면-부전 일대, 남포동-광복동 일대가 High-High 클러스터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 고위험 상권이 공간적으로 밀집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원도심 일부 주거지역이나 교외 외곽 상권에서는 Low-Low 클러스터가 나타나 비교적 안전한 상권들이 모여 있었다. 이러한 공간분석은 부산 내 젠트리피케이션 위험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표 10>의 공간 시차 모형 분석에서 공간확산 계수(ρ)는 0.2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p<0.05),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공간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해준다. 인접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은 해당 상권의 위험도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해운대 중심 상권의 고급화가 인근 지역으로, 서면 상권의 변화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는 연쇄효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 확산 효과는 공간적 비대칭성을 보이며 거리에 따라 감소하여, 2차 이상 떨어진 상권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발달상권(위험도 0.454), 전통시장(0.449), 골목상권(0.433)의 순차적 위험도 결과는 단순한 수치적 차이를 넘어 도시재생사업 노출도와 외부 자본 투자 매력도의 차별적 특성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발달상권은 교통 접근성과 인구 밀도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데, 이는 Smith(1996)의 지대 격차 이론에서 강조한 최고최적이용 압력이 공간적으로 구현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의 위험도 격차가 불과 0.016으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상권 유형이 아직 대규모 정비사업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자체가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적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전통시장 중 상권확장 변화를 보인 동래시장과 새감만종합시장 등과 관광특성을 가진 골목상권인 달맞이길, 해운대로570번길 등은 개발압력이 증가하면 급격히 젠트리피케이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Zukin et al.(2009)이 제시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단계적 모델과도 부합한다. 즉, 발달상권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지속적인 고급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외부 개발사업이나 관광지화와 같은 정책 변화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잠재 단계로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예측 모형은 도시재생사업이나 관광특구 지정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 변수를 포함하지 못한 방법론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Hackworth & Smith, 2001; Harvey, 1989), 이러한 변수의 부재는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위험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우려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시지가 상승률, 업종 다양성 변화, 교통 접근성 개선과 같은 변수를 통해 정비사업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공시지가 5년간 상승률이 1.5배 이상인 23개 상권 중 18개가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으로 나타나 공시지가 변화가 정비사업 효과를 사전에 반영하는 신호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업종 다양성 변화 또한 상권 구조 변화의 초기 신호로 유효하게 작동하였다. Diversity 값이 +0.2 이상 증가한 14개 상권 중 92.9%가 3년 이내에 임대료 급등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Meltzer & Ghorbani(2017)의 연구에서 제시한 업종 전환 신호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회귀분석 결과, 관광상권 변수(0.20)와 인구밀도(0.18)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에 가장 강한 양의 영향을 미쳤고, 평균 생존개월수(-0.12)는 음의 영향을 보여 상권 안정성이 위험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핵상권, 공시지가 상승률, 생산가능인구 등의 변수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젠트리피케이션 고위험 지역으로 해운대 관광권, 센텀시티-마린시티권, 서면-전포 카페거리, 경성대-광안리 수변상권, 남포동-광복로 상권이 식별된 반면, 송정동 상권과 감천문화마을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관광객 수보다 상업화 양상이 젠트리피케이션 위험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214개 상권을 대상으로 머신러닝 기법과 공간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를 예측하고 그 공간적 확산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LGBM 모델이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나타내었으며(R2=0.88), 관광특성(tourism), 인구수(pop_sum), 업종다양성 변화(diversity)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상권 유형별로는 발달상권(0.454)이 가장 높은 위험도를 보였으며, 전통시장(0.449)과 골목상권(0.4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간분석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의 공간적 군집성(Moran's I=+0.16, p<0.01)과 인접 상권 간 확산 효과(ρ=0.28,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발견이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개별 상권의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상권 유형별 구조적 해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발달상권의 성숙단계 고급화 압력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잠재적 취약성은 이러한 공간적 확산 맥락에서 더욱 명확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 결과는 데이터 기반 정량적 분석에 의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공동체 역량, 사회적 연대감 등 정성적 요인의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량적 분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지역공동체 차원의 대응과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등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도출되었다. 머신러닝 기반 위험도 예측과 공간적 확산 분석을 통해 부산시가 2017년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며(부산시청, 2017), 특히 원도심 활성화 과정에서 제기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부산일보, 2014)에 대한 체계적 분석 결과로서 상권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 접근법은 부산광역시의 다핵상권 구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 상권과 주변 상권의 유기적 연계 관리가 필요하다. 도출된 공간확산 계수(ρ=0.28)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인접 상권으로 전파되는 특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므로, 상권을 개별 단위가 아닌 권역별 통합 생태계로 접근하는 정책 프레임워크가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관광 중심 상권에 대한 차별화된 임대료 안정화 정책이 요구된다. 관광특성 변수(tourism)가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해운대, 남포동, 광안리 등 관광특구에는 상생협약, 임대료 상한제,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특화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Newman & Wyly(2006)가 뉴욕시에서 강조한 '거주할 권리(right to stay put)' 관점에서 볼 때, 부산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은 단순한 개발 억제보다는 기존 주민과 상인들의 정착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셋째, 데이터 기반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Chapple & Zuk(2016)이 제안한 젠트리피케이션 조기경보 접근법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예측 변수들을 활용한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경보 및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권 유형별로는 차별화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전통시장의 경우 상인 안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 영업 점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임대료 안정화 지원, 폐업 위기 점포 컨설팅 등을 통해 상인들의 경영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 발달상권의 경우 교통 중심지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 젠트리피케이션 영향평가, 상업 다양성 유지를 위한 용도 규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으나, 급격한 상권 활성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점진적 발전 유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다핵 상권 구조와 관광 중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분석 변수를 개발하고, 첨단 머신러닝과 공간계량분석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공간적 역학을 입체적으로 규명했다는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다만, 임대료 실거래 자료 등 직접적 젠트리피케이션 지표의 부재와 5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적 범위로 인한 장기적 추세 분석의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카드매출 데이터, 민간 부동산 거래 정보 등 다양한 미시적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예측과 시계열 데이터 기반 종단적 분석이 요구된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부산시가 2017년 발표한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조현경, 2017)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당시 부산시가 제시한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상생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해소 방안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상권별 맞춤형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접근법이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 위험도 예측 모델과 상권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는 부산광역시의 다핵상권 구조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수립의 과학적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의 정량적 예측과 공간적 확산 메커니즘 규명을 통해 부산광역시 상권 변화 현상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지속가능한 상권 발전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구축과 상권별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는 다핵도시 구조를 보유한 타 광역시의 상권 변화 예측 및 정책 개발을 위한 범용적 분석틀로 확장 적용 가능하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국제적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Newman & Wyly(2006)가 뉴욕시 사례를 통해 강조한 '거주권 보장(Right to Stay Put)' 개념을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에 적용한 '영업권 보장' 관점과, Shaw(2005)가 지적한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Shaw & Sullivan(2011)이 분석한 문화예술 활동과 젠트리피케이션 간의 역설적 상관관계, 그리고 Wyly & Hammel(1999)이 제시한 주택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공간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산의 다핵상권 특성에 최적화된 통합적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현진·지상현(2020)은 서울시 성수동 사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과 안티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이 실제 도시 현장에서 동시적으로 혼재•공존하며 나타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다층적 공존 양상은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전략 수립 시 정책 간 일관성 확보와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214개 상권을 대상으로 머신러닝 기법과 공간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결합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 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그 확산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LGBM 모델의 높은 예측 정확도와 공간시차모형을 통한 공간적 확산효과의 실증적 검증은 지방 대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에 실질적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임대료 실거래 데이터가 부재하여 공시지가 상승률을 대체변수로 사용하였으나, 권리금이나 보증금 변화와 같은 실제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정책 변수의 부재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횡단면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의 시계열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머신러닝과 공간계량분석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다핵 상권 구조 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공간적 역학을 입체적으로 규명했다는 학술적 기여를 지닌다. 특히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변수 설계와 상권 유형별 차별화된 위험 요인 분석은 향후 지방 대도시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의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동태적 전개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패널 데이터 구축을 통한 시계열 동태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또는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 등의 고급 계량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시점, 진행 속도, 지속 기간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정책 개입의 최적 타이밍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권의 생애주기(commercial district life cycle)와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단계 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예방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Zukin et al.(2017)이 제시한 온라인 레스토랑 리뷰 데이터 활용 방법론을 도입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상권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은 전통적인 공적 통계자료의 시차적 한계를 보완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조기 탐지를 위한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관광특구 지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한 GIS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업 진행 단계별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매출, 유동인구,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등을 활용한 미시적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산에서 개발된 예측모형을 대구, 광주, 대전 등 유사 지방도시에 적용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비교도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정책 개입 사례의 사전-사후 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정책의 차별적 효과성과 최적 정책조합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도 요구된다. 특히 임대료 상한제, 상생협약,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다양한 정책 수단들의 효과를 자연실험 설계나 준실험 설계를 통해 엄밀하게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이 상권 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중요하다. 팬데믹 이후 변화된 소비 패턴, 비대면 경제의 확산, 원격근무의 일상화 등이 상권 구조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상권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확장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